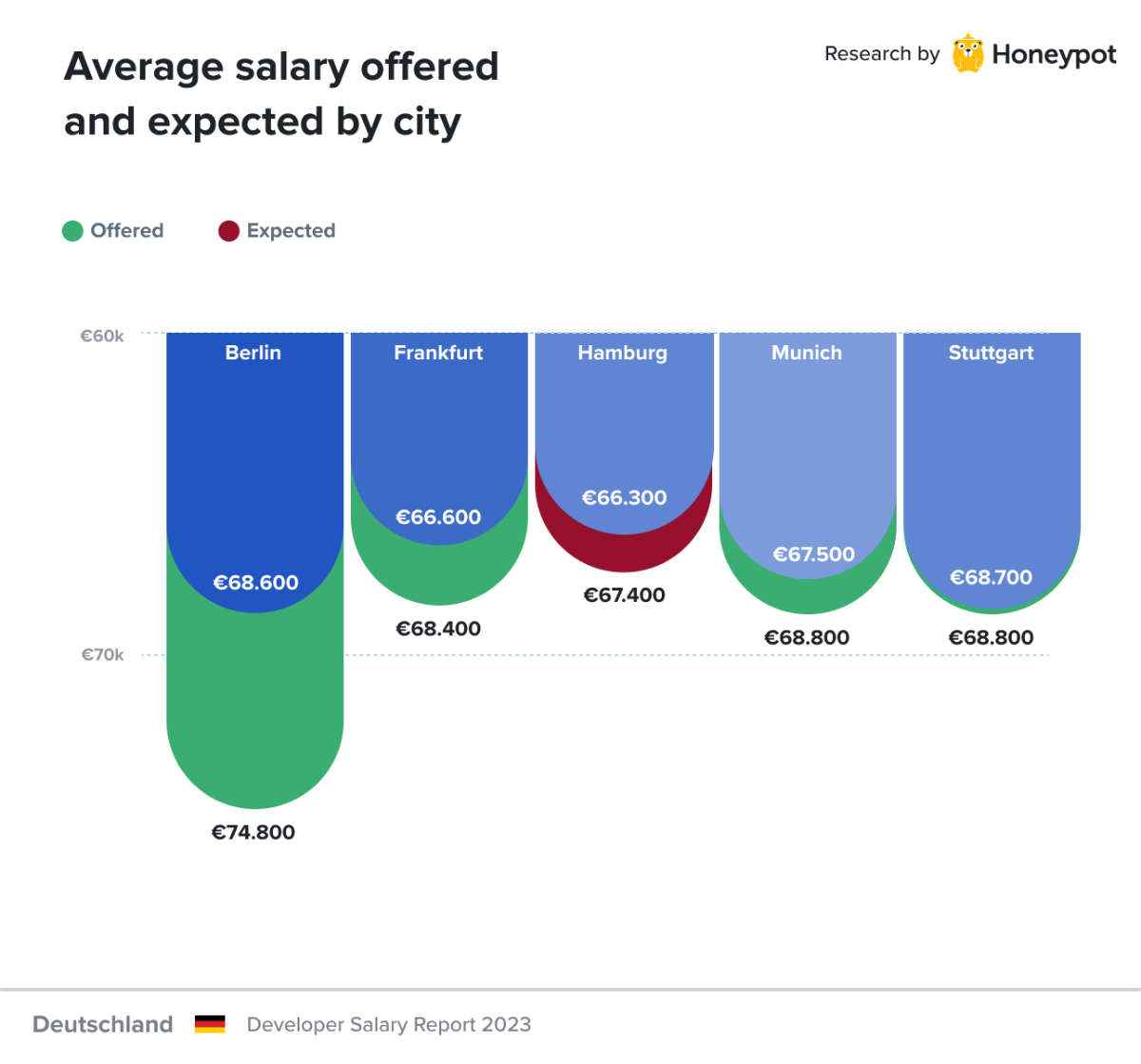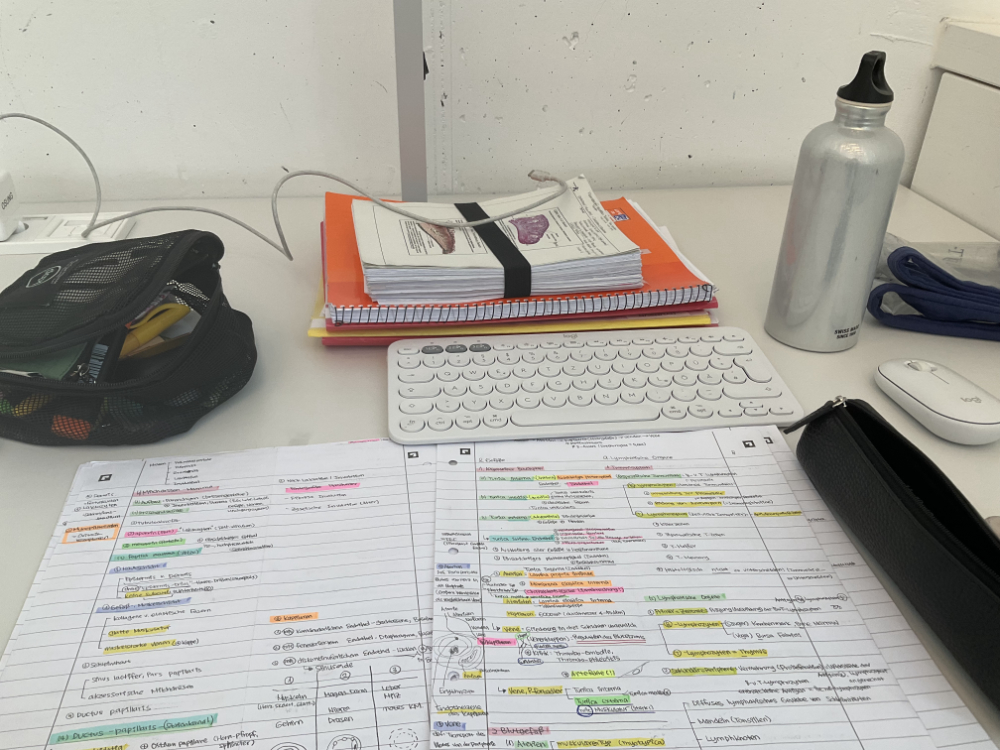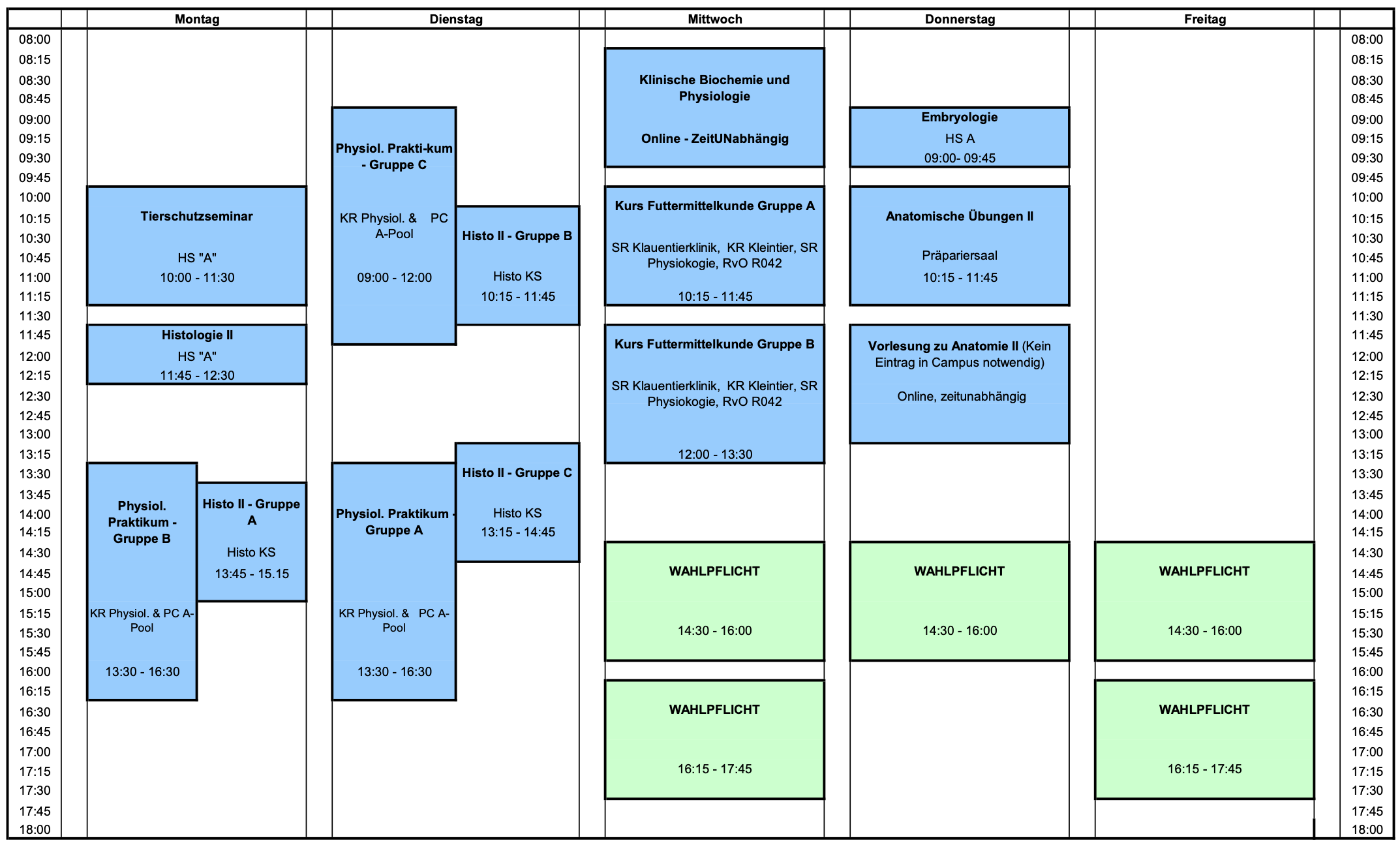파리지옥 영상이 너무 잔인했나보다.
파리지옥을 궁금해 하길래 파리지옥 영상을 보여주니 얼마 보지 못하고 무섭다고 손사래를 치며 내 품에 안겨버렸다.
그리고 이내 잠이 오는 듯 잠투정처럼 조용히 말을 하는데…
“파리지옥 무셔”
“엄마, 파리지옥 무셔”
“엄마가 파리지옥 가- 할테니 걱정마.”
이외에도 파리지옥이 많냐, 여러가지 말을 중얼거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파리지옥 가-를 50번 정도는 되풀이하더니 잔다.
좀이따 침대로 옮겼는데 내리는 그 순간, 아들이 내 뱉은 파리지옥 가-
아들아, 미안하다.

# 누군가 그랬다.
아기가 생기고, 게다가 말도 안통하는 외국에 와서 필요없는 존재로 하루하루 소모해가는 듯 하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독일어는 하면 내게 도움도 되고 남는 장사인거 같다고.
내 방이 생겼다.
오늘은 시작의 날이라서 온갖 여러 가지를 정리했고, 새로운 음악도 듣고, 딴 짓도 많이 했으니 내일부터 시작해보자.

# 엄마와 아빠

한국을 방문하고 물욕이 늘었다고 느낀다.
그 예로 오늘은 10만원짜리 빗자루를 보고 있었다.
(증거자료: https://www.irishantverk.se/en/articles/2.47.105/iris-hantverk-dustpan-brush-set-black)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졌나보다.
그래도 한국을 다녀오고, 그 전보다 자주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는 느낌도 괜히든다.
남편은 피엘라벤 모자를 쓴 날이면 다른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느낀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것이 정말인지, 우리 스스로가 + 자신감이 생긴 건지,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최근 1개월 간 관심없던 화장품과 물건에 기웃기웃 거리고 있다.
어린이날 선물로 산 아들의 10만원짜리 크레인 장난감이 고장날까봐서 괜히 혼냈던 나를 보며 역시 법정스님이 말했던 무소유를 머리속으로 되새기었건만.
어머님, 무소유.

#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느낌.
몇 년이 더 지나면 달라질까? 사실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 너도 힘들었나보다.
i don’t bite u.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나를 물어 뜯을까, 나를 속일까, 너를 해칠까, 너에게 상처를 줄까.
너무 무서워요.

‘뭐야-‘
읽고 있던 산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내뱉은 소리.
이 산문은 재미있어서 틈이 나면 내달리 듯, 게다가 남의 달콤 씁쓸한 사생활을 몰래 읽은 듯한 기분이었다.
작가는 내 마음을 알았기에 그 책의 끝은 독자인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관음의 끝은 허무인가.
잘 모르는 사람의 Too Much Information 사생활의 낯을 봐서일까.
읽는 동안, 다 읽고 나서도 ‘이렇게 글을 써도 되는구나.’ 감탄하고.
‘작가가 솔직해져야한다는게 이런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여행하는 동안 썼던 일기, 그 일기를 엮어서 책을 내려고 할 때 어디까지 보여줘야할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고민은 무슨, ‘알 몸으로 벌거 벗었어야 했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알몸이 되어야 책 한 권에 차라리 후회가 없겠다.
그의 첫 책 ‘보통의 존재’를 다시 읽고 싶어졌다.
한국에서 18년 4월, 이석원 작가의 ‘언제들어도 좋은 말’을 읽고.
가끔 힘이 들 때 글을 쓰면 해소가 되었다.나는 그 해소의 느낌을 잘 알고 있어 일부러라도 글을 쓰고 푸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이 안 되어서 힘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큰 상실감을 느꼈을 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남편에게, 가족에게,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을 때,
독일에 살면서 차별이라는 대우를 받았을 때
등등등.
그런데 이번에는 글을 쓰면서 그 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기 싫을 정도.
관련된 일이라고는 눈꼽만치도 하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냥 허투로.
미친놈을 만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피해야만 한다. 참, 대단한 이웃이다.